때로 한 장면이 스친다.
오묘초
Special Feature
때로 한 장면이 스친다.
오묘초
때로 한 장면이 스친다.
모래와 물로 이루어진 지층 속, 빛의 비늘처럼 미세하게 깜박이는 무언가가 내가 만든 조각을 아주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심해 생물의 촉수처럼 들어 올리고 있는 광경. 그 무언가는 투명한 손가락 같은 섬세함으로 유리 표면을 쓸고 닦는다. 빛은 수백 갈래로 갈라져 유리 내부의 기포가 형성한 극히 미세한 구조를 추적한다. 그 기포들은 마치 잊힌 기억이 물질의 틈에 스며든 흔적처럼 가느다랗게 떨린다. 그러나 그 빛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못한다.
“멈춘 형태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가?”
나는 종종 상상한다. 내 조각이 언젠가 빛과 소금으로 이루어진 먼 미래의 낯선 손들에 의해 발굴될 그 순간을. 그들은 유리 표면 위의 굳어버린 미세한 결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이 결이 흘러간 시간의 파문인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그리던 흔적인지 조심스레 판단하려 할 것이다. 내가 만드는 조각은 언제나 고열 속에서 시작된다. 광물은 녹아 마치 유체처럼 흐르다 서서히 다시 굳는다. 그 시간 동안 중력, 점성, 작업실에 흘러 다니는 먼지 입자 하나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형태 속에 스며든다. 나는 그것을 물질의 기억이라 부른다. 조각은 정지되어 있으나, 내 눈에는 그 안에서 극히 미세한 파장들이 불규칙하게 맥동한다. 형태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다. 내가 얻은 것은 한때 흐르던 존재가 멈춘 한순간의 포착일 뿐이다. 내가 그 조각을 만들기 전에도, 그리고 만든 후에도, 그것은 어딘가에서 광물의 결로 존재해 왔고 존재할 것이다. 작업대 위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부유한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가?”
지금 나는 『가제:메모리 서쳐』라는 SF 소설을 쓰고 있다. 소설은 지구의 표면이 모두 타버린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하늘은 기체로 사라지고, 대기는 무수한 금속 입자로 대체된다. 그 입자들은 빛에 부딪힐 때마다 무수히 다른 색으로 깜박인다. 그 깜박임은 마치 잃어버린 세계의 잔해처럼 허공을 떠돌고 있다. 그 속에서 생명들은 점점 뜨거워지는 대기를 피해 깊은 바다로 숨어들었다. 살아남기 위해 인류 또한 바다 속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한 피난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몸을 심해 생물의 구조와 결합시켰다. 광물질의 외피, 빛을 흡수하거나 발광할 수 있는 살갗, 극한의 수압에서도 찢어지지 않는 장기, 폐와 아가미의 교차적 호흡—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신(新)인류를 빚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개개인의 고유한 기억이 타자에게 이식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바다달팽이에서 얻었다. 2022년, 뇌과학자 고혜영 박사와 함께 〈과학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이라는 프로젝트(전시 《데이터 정원》(수림문화재단, 2022))를 하던 중 바다달팽이를 이용한 기억이식 실험을 알게 되었다. 작고 투명한 생명체의 신경세포 일부를 다른 개체에 이식하자, 새로운 개체가 이전 개체가 느낀 공포에 똑같이 떨며 반응했다. 그 논문을 덮고 나는 오랫동안 숨죽여 앉아 있었다. 작은 생각이 점차 부풀어 거대한 세계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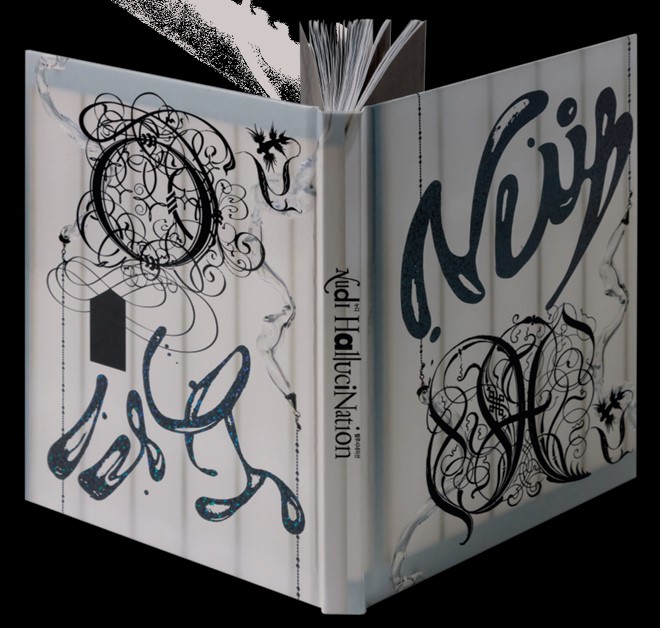
『누디 핼루시네이션』의 표지
“기억이 이렇듯 물질이라면, 타인의 옮겨진 기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일까?”
그 질문은 내가 만드는 조각만으로는 끝까지 파고들 수 없었다. 조각은 결국 고정된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인류 이후의 생명체들이 끝없이 증식하기 시작했다. 어둠의 심해 속, 유리처럼 맑고 차가운 물결 사이에서 빛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종, 서로의 살갗 위에 기억의 무늬를 새겨 넣으며 존재를 확인하는 종. 그들은 모두 인간이 남긴 기억의 잔재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었다.
내가 그리는 세계 속에서 기억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 누군가의 폐를 스친 공포의 떨림, 누군가의 살결 위에 남은 희열의 잔상—그 모든 것이 빛과 파장으로 변해 서로의 몸속을 유영했다 기억 거래는 보편화된 콘텐츠로 소비되었고, 때로는 교환 가능한 쾌락이 되었으며, 때로는 타인의 심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서늘한 구멍이 되었다. 나는 그 세계를 붙들고 싶었다. 내가 만드는 조각은 어쩌면 바로 그 미래 생명체들의 단단히 굳은 몸일지도 모른다. 금속과 유리로 빚어진 멈춘 형상이지만, 내 눈에는 그 형상이 늘 심해의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조각은 몸이 되었고 글은 그 몸이 살아가는 세계가 되었다.
늘 형태로 세계를 표현하려 했지만, 형태는 언제나 벽처럼 돌아왔다. 조각은 회화보다 입체적이지만, 결국은 물질이다. 내가 그린 세계 안에서 넘어설 수 없는 투명한 장벽이 있었다. 반면 글에는 형상이 없다. 글은 읽는 이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매번 새로운 상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글을 미래의 조각들이 살아가는 세계로 놓고 그 위에서 조각이 놓이는 장소와 시제를 흔들어보고 싶었다. 소설 속 활자들은 형태가 말을 멈춘 뒤에도 그 뒤를 따라오는 끈질기고 은밀한 이야기를 붙들어 둘 수 있다. 좋은 소설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눈앞에 풍경을 펼쳐낸다. 이야기의 구조는 독자들에게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이미지를 그리게 만든다. 그래서 ‘문학도 미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느 날, 이 글이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SF문학으로 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때 출판사에 원고 일부를 보냈다. 지금 이 소설은 허블출판사(동아시아)와 계약되어 있다. 출판과는 별개로 작은 작품집 형식의 노벨라(중편 소설)를 추가로 구상했다. 『누디 핼루시네이션』이 바로 그 노벨라 형식의 책이다. 소설의 시작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각 챕터마다 동명의 조각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이미지들은 단순한 삽화가 아니다. 나는 그 이미지들이 문장과 부딪치며 파문을 일으키기를 원했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서로를 밀고 당기며 아무도 본 적 없는 지도를 독자들 머릿속에 그려내길 바랐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 넣은 바다달팽이의 부위별 학명과 해부학적 구조를 글 사이사이에 심었다. 소설은 미래의 오지 않은 현실을 파고들다 때로는 해양학 논문인 양 안내하고 주인공은 다시 심해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이 책에서 현실과 가상이 서로의 살결을 스치며 함께 침몰하는 그 경계를 나는 좋아한다.
나에게 조각은 현실이다. 바다달팽이는 태곳적 과거다. 그리고 책 속의 이야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다. 조각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처럼 만들어지고, 글은 그 조각을 뒤따르며 확장한다. 어떤 날은 글이 저만치 앞서 나가고, 어떤 날은 조각이 먼저 다가올 이야기를 보여준다.
와이팩토리얼의 이승현 디자이너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책으로 봉인했다.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 각 장의 질감, 작품 이미지와 텍스트의 위치—그 모든 것이 심해 생물의 껍질처럼 겹겹이 쌓여 미래의 파편을 흘려보내는 하나의 이질적인 생명체처럼 느껴진다.
글은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불러온다. 고정된 형상이 아니다. 독자마다 다른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누군가는 검푸른 심해를 보고, 누군가는 하얗게 결빙된 미래의 도시를 본다. 나는 이 두 개의 다른 성격을 지닌 작업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읽히기보다는 넓게 퍼져나가길 원한다.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미래의 형체를 더듬고 있다. 조각은 존재의 증거이고, 글은 존재의 가능성이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형태를 만들고, 언어를 새긴다.
나는 여전히 물질을 다룬다. 그리고 여전히 머릿속에 남은 미래의 이야기를 쓴다.
『누디 핼루시네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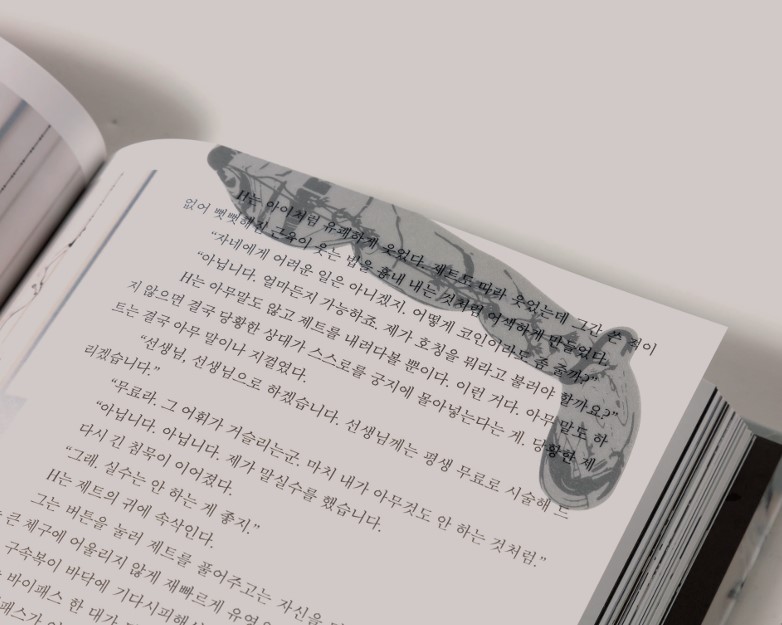
『누디 핼루시네이션』의 내지
먼 미래, 지구의 표면은 이미 불타 잿더미로 변했고, 인류는 결국 심해로 내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심해 생물의 신체 구조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피부는 유리처럼 투명하거나 빛을 발하며, 서로의 존재를 빛의 흔들림으로 감지한다. 물속에서 인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있었다. 신인류가 살아가는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이다. 기억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미래의 지성체들은 타인의 기억을 재화처럼 사고팔았고, 누군가의 마지막 희열이나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다른 이의 내부로 스며들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 ‘메모리 서쳐’라 불리는 기술자다. 그는 타인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다른 이의 신경망에 주입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동료이자 친구였던 제트가 죽고, 노아는 그가 남긴 흔적 속에서 거래되어서는 안 될, 금지된 기억들을 발견한다. 훼손된 기억들을 사고파는 세계에 발을 들이며 휘말리는 사건에서 시작되는 소설이다.
© (주)월간미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