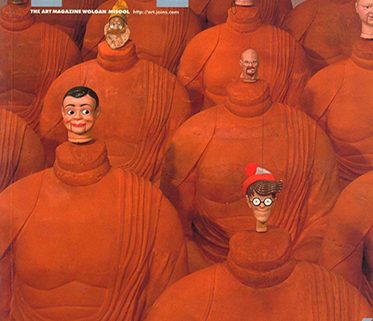최예선의 달콤한 작업실 8
옛날 음악을 들으러 갔다
집에 있던 J의 오래된 턴테이블을 작업실로 옮겼다. 뽀얗게 먼지가 앉은 LP판들도 박스에 담아왔다. 오랫동안 내버려둔 물건이라 제대로 소리가 날까 모르겠다. 망가진 바늘칩을 새것으로 바꿔 끼우고 카트리지를 이리저리 움직이니 플래터가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한다. 아무 판이나 꺼내서 얹었다. 존 덴버가 희생양이 되기로 했다. ‘퍼햅스 러브’. 존 덴버의 미성이 매끄럽게 뻗어나가면 플라시도 도밍고가 바이브레이션 바리톤으로 중후하게 이어가는 그 노래.
판이 돌아가자 클래식 전주부터 울렁울렁하더니 존 덴버의 미성은 어디 가고 테이프 늘어진 노랫소리를 뱉어낸다. 존 덴버가 머쓱해할 만큼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벨트가 늘어진 모양이다.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을 눌러보고 카트리지의 이음새를 살펴보고 여러번 돌려보니 본래의 속도를 찾아간다. 존 덴버의 울렁증도 줄어들었다. 그제야 나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종이재킷에 든 LP들을 박스에서 꺼낸다.
“세상에! 이게 언젯적 물건이야!”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폴 모리아 앙상블의 추억의 영화음악, 1980~1990년대 유행했던 음악들이 뛰쳐 나온다. 들국화, 015B, 이문세, 팻 매스니, 비틀스 베스트, 퀸, 조지 마이클, 그리고 유재하.
한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서 영면에 든 유재하. 그 빛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뭉클한 시간이 흘렀다. CD의 선명한 음질과 다른, 먼 곳에서 들리는 듯하면서 조금은 느린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울린다. ‘비 오는 날의 수채화’나 ‘여행스케치’처럼 낭만이 풀풀 쏟아지는 이름들 앞에서는 그만 머쓱해진다. 직경 30cm짜리 재킷을 더듬어보니 엉성한 레이아웃과 강렬하지만 빛바랜 컬러가 눈에 안긴다. 지금의 산뜻함, 세련됨과는 다른 손맛 나는 물건이라고 해두자.
1990년대의 풋풋한 대학생 밴드인 ‘015B’는 혜성처럼 등장했었지. 보컬 윤종신의 목소리가 더할 나위없이 맑고 곱다. 나는 무한궤도의 신해철을 더 멋진 아티스트라 여겼지만 윤종신의 감미로움을 멀리할 수는 없었던 기억이 난다. 20년 전에 말소된 소리들이 기억처럼 퍼져나온다. 음악은 기억과 접목되어 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내 몸이 떠오른다. 음악을 듣고 노래를 따라 부르던 나, 혹은 우리. 영화 <더티 댄싱>의 사운드 트랙은 영화보다 아름다웠다. ‘헝그리 아이즈’의 신나는 리듬, ‘쉬 라이크 더 윈드’의 나긋한 발라드. 리듬이 분명하고 흥겨운 가사가 명쾌하다. 그땐 음악이란 들으면서 몸을 흔드는 거였다. 어쩌면 온몸을 관통하는 감미로운 ‘음악의 시대’였다. 지금과는 다른 음악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다.
턴테이블을 가져다두었다고 하니 친구들이 구경하러 왔다. LP를 모으고 듣던 세대들이라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책장 어딘가에 꽁꽁 싸인 채 꽂혀 있던 LP들, 그러나 아무렇게나 처분할 수 없는 것들을 작업실에 가져다주기도 했다. 하나하나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고 플래터에 올리면 약간의 뜸을 들인 후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 잠깐의 무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영화가 시작된 직전의 암전에서 느끼는 기대감과 같다고 할까? 아날로그 시대의 음악이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검은 비닐을 고르고, 먼지를 닦고, 바늘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움직이고 바늘이 검은 홈 사이의 굴곡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굴곡의 신호가 모여 음악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되기 전 약간의 쉼표, 두어 마디 정도 튀거나 지지직거리는 소리도 감수하는 것. 수고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들은 더 큰 아름다운 무언가를 돌려준다.
한번은 J가 LP가 한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왔다.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의 LP라고 했다. 그는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다. 오죽했으면 낡은 LP까지 모두 꺼냈을까. J는 LP 상자를 홍대 앞 중고 LP가게에 가져갔다. 가게에서는 이유를 대며 선배의 LP를 구입하지 않았다. J는 미안한 얼굴로 묵직한 상자를 선배에게 도로 가져갔다.
“차라리 다행이래.”
그날 저녁 J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옛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그것마저 모두 팔렸다면 얼마나 쓸쓸했겠냐며.”
LP 상자를 다시 받아들고 안심했을 선배를 생각하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이 있음을 알겠다. 먼지가 자욱한 다락 한 켠에 놓여있더라도 추억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우리의 슬픔은 줄어드는 지도. 무용해 보이지만 간절한 물건들이 있다. 이 물건들은 삶의 드라마를 하나씩 품고 있다. ●